영화 개봉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범수는 ‘신의 한 수’ 속 ‘살수’가 아닌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였다. 현재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하다. 간혹 ‘깐깐한 인상의 선생님’ 얼굴도 비춰지는 듯 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딸 얘기에는 금방 ‘딸 바보’ 아빠로 변신했다. 순식간에 뒤바뀌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래서 이범수”란 말이 절로 나왔다.
“사실 데뷔 20년이 넘었지만 전 지금도 그냥 아저씨일 뿐이에요. 주변에서 또 제가 하는 일이 배우라서 그렇지(웃음). 집사람도 별로 절 그렇게 안봐요. 우리 딸도 그렇고. 그냥 뭐 집에 있으면 전 아내에겐 하인이고, 딸에게는 장난감 같은 존재(웃음). 간혹 행사에 가면, 영화 VIP시사회에 같은 데서 기자님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아내나 딸이나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럴땐 으쓱하죠.”
가족들에겐 그렇게 한 없이 약하고 넓은 가슴을 가진 이범수가 영화 ‘신의 한 수’에선 절대악 ‘살수’로 나온단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아니 우선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별로 신경 안 쓴단다. 철저하게 자신의 일을 존중해 주는 아내의 선택에 너무도 고맙다고.
“제가 한 번 빠지면 잘 헤어 나오지 못해요. 그런 모습에 아내는 마냥 좋아만 하죠.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도 ‘살수’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줬죠. 뭐 감정적으로 내가 유지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구요. 제가 뭔가에 빠지면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줘요. 제가 바쁜 게 좋다나(웃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의 한 수’는 바둑과 액션의 결합이란 전무한 시도에서 시작됐다. 거기에 ‘근본’ 자체가 ‘악’인 캐릭터가 그를 더욱 잡아끌었다고. 배우로선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은 영화였고, 더욱 만나기가 쉽지 않은 캐릭터였다. 안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였단다.
“평소 바둑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분야였어요. 그런데 시나리오 하나를 받았는데 ‘바둑’영화더라고요. 호기심에 봤는데 액션이에요. 전혀 매치가 안됐죠. ‘바둑 영화인데 액션영화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관심만 있었지 바둑 자체에는 문외한이죠. 그런데 너무도 쉽게 시나리오가 읽히는 거에요. 악역에 대한 욕심도 좀 있던 시기였는데 딱 맞게 배역도 그랬고. 더군다나 상대역이 우성씨였던 저죠. (웃음)”
이범수와 정우성은 1999년 ‘태양은 없다’에서 이후 무려 15년 만에 한 작품에서 만났다. 워낙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교류는 많았지만 한 작품에서 호흡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옛동지를 만난 듯 반가웠다고. 신인 시절에 만난 두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 가는 중추가 돼 있었다.
“너무 반가웠죠. 서로 발전된 모습으로 만났으니. 우선 태석이란 인물을 정우성이 한다고 하니 비주얼과 완성도는 반 이상을 따고 들어가겠구나 했죠(웃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배우 가운데 정우성보다 액션을 더 잘하는 배우 있나요. 물론 연기도 잘하죠. 정도홍 감독님이 ‘정우성이 배우 가운데 액션을 가장 잘한다’고 하셨다는 데,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탄성이 절로 나와요. 그런 배우와 내가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복이죠. 복.”
대중들과 평단은 ‘신의 한 수’의 ‘신의 한 수’를 정우성의 존재감에서 찾으려고 한다. 정우성이란 배우의 상품성과 스타성이 그만큼 이번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정우성이 연기한 대척점에 선 ‘살수’의 존재감을 표현한 이범수의 아우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호평이다.
“악역은 9년 전 ‘짝패’의 ‘장필호’ 역할 이후 처음이에요. ‘살수’와 ‘장필호’를 같은 선에서 놓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악역의 개념에서 보자면 완벽하게 다른 근본을 갖고 있어요. 장필호는 철저하게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인물인데 반해, 살수는 ‘속을 알 수 없는 주도면밀한 뱀 같은 인물’이에요. 빈틈 자체가 보이면 안되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조금의 틈이라도 보일까봐.”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살수’의 외모, 포마드를 발라 뒤로 빗어 넘긴 완벽한 올백 헤어스타일, 무테안경, 블랙 정장, 대사 톤과 눈빛, 모든 게 이범수의 계산에서 나온 디테일이었다. 영화 속에서 혐오스럽게 등장한 야쿠자 스타일의 전신문신도 이범수의 제안으로 탄생됐다. 이범수가 말한 ‘살수’는 ‘속을 알 수 없지만 그 속이 드러날 경우 한 치의 동정도 가선 안되는 혐오스런 악당’이어야 했다. 당초 시나리오 속에 설정된 ‘살수’는 스포츠머리에 둔중한 느낌의 아저씨였다.
“살수에겐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배어나와야 했어요. 깔끔한 정장 안에 무언가 감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신문신이 생각났어요. 감독님도 흔쾌히 동의해주셨죠. 사실 그 문신 만드는 데 한 20시간 정도 걸렸어요. 어디 기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죠. 당시에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나’ 진짜 후회도 되더라구요(웃음). 그래도 좋게 봐주시니 지금은 너무 기분이 좋죠.”
공교롭게도 그는 ‘신의 한 수’를 촬영하면서 드라마 ‘트라이앵글’을 병행했다. 드라마에선 한 없이 선한 히어로 같은 인물이다. 완벽하게 다른 두 인물을 연기하면서도 그는 두 작품을 이끌어 갔다. 이범수가 앞서 설명한 ‘집중하고 즐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많이 힘들죠. 그렇게 연기하면. 하지만 반대로 완벽하게 다른 인물이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한 인물이라면 나 스스로도 캐릭터에 대한 구분점을 두기가 힘들었을 거에요. 각각의 현장에서 느끼는 활력이 나한테 어떤 자극제로 다가왔다고 할까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그 재미를 느끼고 있구요.”
그는 두 현장에 만난 다른 두 인물에 대한 칭찬과 존경도 빼놓지 않았다. ‘트라이앵글’ 속 김재중과 ‘신의 한 수’의 대선배 안성기다. 두 사람을 통해 정말 다르지만 많은 것을 지금도 배운다고.
“아이돌 출신에 대한 선입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나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재중이는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인상 한 번을 안써요.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작품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경건해요.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참 괜찮은 친구에요. 안성기 선배님은 뭐 내공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시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감이랄까. 갑자기 제가 한 ‘짝패’에서의 대사 생각나는데 ‘강한 놈이 오래가는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는 대사 생각나시죠. 안성기 선배님을 보면 딱 그 말이 생각나고 존경심이 생겨요. 저렇게 오래하시니깐 존경을 받는구나. 물론 그 오래가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하시고.”
이범수는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스케줄에 쫒기지 않고 얘기꽃을 피우며 자리를 뜰줄 몰랐다. 데뷔 20년이 가까워 오는 시간 동안 여러 부침을 겪은 그가 터득한 득도의 방식은 ‘소통’이었던 것 같다. 사람과의 소통, 동료와의 소통, 작품과의 소통. 그렇게 그는 자신을 지우고 무색 무미 무취의 배우로서 가꿔 나가고 있었다. 그렇기에 어떤 색깔의 어떤 작품의 어떤 캐릭터를 입혀도 결과는 정답으로 나왔다. ‘신의 한 수’ 흥행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나.
김재범 기자 cine517@

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cine5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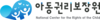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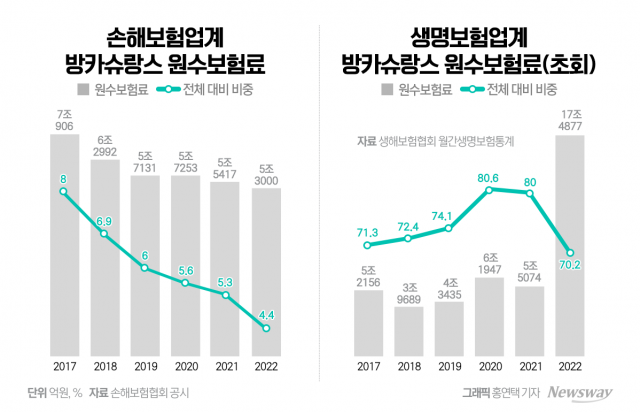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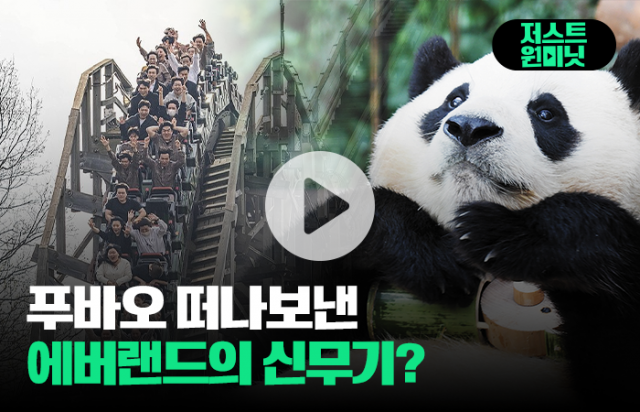






댓글